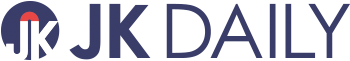옛날, 한일의 시민사회 간 교류가 막 시작되던 시절, 서로에 대한 오랜 오해와 불신 속에서 이제 겨우 서로를 알아가던 시절, 그 1990년대에 ‘일본은’으로 시작해서 ‘있다, 없다’로 끝나는 책들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다만 일본통으로 불리는 그 책들의 저자들은 ‘객관적’이라는 외투를 입고 일본을 말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일반화의 오류’는 피할 수 없었다. 물론 그것은 그 책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든 특정 국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훨씬 매서운 눈으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일, 반일 프레임을 벗어나 서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칼럼은 객관적 서술을 ‘포기’하며 때로는 친일, 때로는 반일로도 읽힐 수 있겠지만 되도록 ‘쓸모 있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매회 통계자료나 영화, 서적 등을 재료로 삼으면서도 그에 대한 해석에서는 필자 개인의 경험과 인상을 덧붙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칼럼은 ‘정답이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인문・사회 과학 분야를 다루기 때문이다. 일반화의 여부는 독자의 몫이 된다는 의미이다. 칼럼을 시작하면서 우선 맛보기로 ‘진실’을 대하는 일본인의 시각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 또한 객관적 사실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며 필자의 경험에 기댄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일본 유학 시절, 최고위 외교관료 출신의 교원이 담당한 일본 외교에 관한 대학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오리엔테이션 다음 주차 수업으로 기억하는데 그 수업에서는 “藪の中(덤불숲에서, 1922)”라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단편소설이 필독자료로 제시되었다. 이 소설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에 의해 라쇼몽(羅生門)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구로사와 감독은 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1951)을 수상한 바 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숲속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왜,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현장에 있던 당사자와 목격자 모두 저마다 다른 진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외교 수업에서 왜 이 소설을 읽고 토론하게 했을까? 아쿠타가와 씨가 후대에 자신의 소설이 일본 외교 수업에서 교재로 읽혀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저자의 의도는 지금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대체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진실’은 알 수 없거나 말하는 사람 수만큼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해서 중국인과 태국인 등 유학생이 많이 참가한 수업이었던 만큼 토론은 ‘예상대로’ 역사인식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역사의 진실은 그 소설의 결론처럼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이러한 ‘열린 결말’이 그 교원이 기대했던 바일지도 모른다. 그 교원은 자신의 의도나 의견은 말하지 않은 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외국인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아니, 아마도 그 교원은 외국인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기보다는 일본인이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했었던 것 같다. 진실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만 어느 한편의 하나의 진실을 다른 편에 강요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것이 필자가 경험한 바에서 얻은 일본의 역사인식이나 현실주의 외교의 사상적 기반이다. 국제정치에서는 국익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당시의 국제법 관행에 심각하게 저촉되지 않는 한 국제도덕이라는 잣대로 한 국가의 대외행동을 재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대외행동에는 내부적으로 그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는데 그 진실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이 그 교원이 말하고자 한 바가 아닐까 한다. 서로가 다른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역사인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각각의 진실을 서로 존중하자는 것? 필자의 이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밖에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없다.
실제로 필자는 유학 시절에 이와 관련하여 어느 ‘소녀’와 필담을 통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논쟁의 상대를 소녀라고 칭한 이유는 그녀가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우리에게는 가미가제로 알려진 특공대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자신의 작은 외조부를 국가의 ‘영웅’으로 기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소녀는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며 특공대원으로 참전했던 다른 ‘영웅’들 또는 그 유가족을 인터뷰했고 그 결과물은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 소녀에게 태평양전쟁의 ‘진실’은 가해자로서의 군국주의도, 피해자로서의 국가폭력도 아니다. 국가를 위해 젊은 목숨을 내던진 숭고하지만 ‘잊혀진’ 영웅들의 보국전쟁이었을 뿐이다. 그 소녀는 작은 외조부가 영웅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필자의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소녀에게 또 다른 진실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책이 출판되고 유력 언론 매체에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방송에까지 출연한 그 소녀는 지금도 같은 진실을 믿고 있을까?
지금까지 맛보기로 일본인이 진실을 대하는 시각과 관련하여 몇 자 적어보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경험에 기댄 해석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성’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어떤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한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말이다. 하지만 국민성을 ‘문화’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반화의 오류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진실을 대하는 시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문화의 영역에서 다룬다면 일본인은 진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은 일본인이 ‘전쟁을 기억하는 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회 칼럼에서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 前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공 조교수
- 現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서강대・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 저서 <한반도냉전과 국제정치역학, 아카시쇼텐>
- 한겨레신문 등 다수 기고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