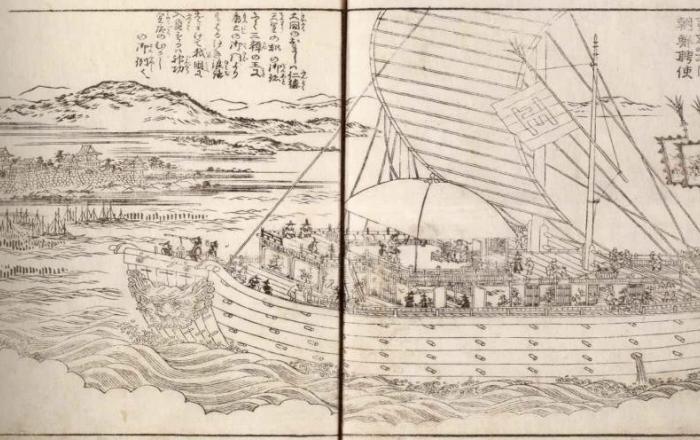오래된 궁금증 하나. 왜 중국에는 무협영화가 많고 일본은 공포영화가 많으며 한국영화에는 욕설과 코믹 터치가 빠지지 않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먼저 일본의 공포영화를 살펴본다. 최근에는 세 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많이 탈색된 특징이긴 한데 일본에는 유령이나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가 참 많다. ‘주온’, ‘링’, ‘사다코’, ‘착신아리’, ‘이누나키 마을’, ‘코도모쓰카이’, ‘주카이숲 마을’ 등 줄을 잇는다. 시야를 만화로까지 넓히면 ’소용돌이‘, ’불안의 씨‘, ’신체찾기カラダ探し‘ ’기생수‘ 등 더 많다. 일본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공포물, 특히 요괴물은 흥행의 보증수표다.
이는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면 전시장 초입부에 아귀도餓鬼圖, 아귀초지餓鬼草紙, 지옥초지地獄草紙, 사문지옥초지沙門地獄草紙, 벽사회辟邪繪 등 요괴에 관한 화집들이 전시돼 있다. 대부분 국보로 지정된 것들이고 흉측한 몰골의 유령과 요괴들이 가득 그려져 있다. 예컨대 헤이안 시대에 그려진 아귀초지의 경우 해골같은 형상에 머리숱은 거의 없고 깡마른 팔다리에 배는 불뚝 솟은 괴이한 형상의 아귀들이 사람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징그러운 장면이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다.
우리 같으면 요사스럽고 점잖지 못한 그림이라 하여 크게 대접받지 못했을 법한 그림들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이 제작되고 대접받고 있다. 그리고 그 맥이 현재까지 이어진 듯 영화, 만화, 소설 등 대중문화 분야에까지 수많은 요괴들이 등장한다. 왜 그럴까?
요괴문화의 시작은 대개 헤이안시대 말 경이라고 본다. 이 시기는 일본의 고대정치가 끝나고 중세가 막 시작되려는 시기였다. 구체적으로는 후지와라 가문의 셋쇼정치攝政政治가 끝나고 다이조텐노太上天皇가 지텐노기미治天の君가 되어 인세이정치院政가 시작되던 시기로 부패가 만연했다. 그리고 막부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으로 어수선했다.
정신적으로는 법상종, 삼론종, 화엄종, 율종 등 학문적 성격의 불교가 천태종, 진언종 등 신앙적 성격의 불교로 교체되며 말법사상과 정토사상이 일본인들의 머리 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말법사상은 부처 사후 2,000년이 지나면 불법을 닦아도 성과가 시원치 않고 요괴가 들끓는 세상이 된다는 믿음이다. 정토사상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아미타불의 불력에 의해 죽어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타력他力신앙이다. 이런 대목들은 불교의 세속화를 암시한다.
이때의 어수선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요괴문화를 잉태시켰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생성된 요괴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지려면 또 다른 연료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신도가 정교한 내세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잦은 천재지변이다.
후자부터 살펴보자. 일본은 잦은 지진과 화산폭발, 태풍과 폭우, 해일 그리고 뒤이은 전염병과 대화재가 잦은 곳이다. 일본사람들은 이런 천재지변으로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졸지에 잃는 경험을 직, 간접으로 숱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느낀 상실감, 불안감은 매우 컷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느낀 불안감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무력감으로 배가된다. 천재지변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무력감의 가장 큰 원인이다. 만약 원인을 안다면 상실감과 무력감을 달래기 훨씬 용이해진다. 대처할 방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비로소 일본인들은 삶의 주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다른 말로는 능동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땅 속에 있는 거대메기가 요동을 쳐 지진이 난다면 거대메기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식의 뭔가 지진예방을 위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지진이 일어난다면 메기 달래기에 소홀했던 점을 찾아 고치면 된다. 속수무책으로 비극을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비극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는 지진과 화산폭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설화와 뒤엉켜 만들어지고 전해진다. 예컨대 ‘하늘의 경고’라는 설에서부터 방금 예로 든 거대메기의 요동이라는 설까지 갖가지 설명이 난무한다.
그런데 무력감을 벗어나 삶의 능동성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사라진 가족은 내 곁에는 없지만 어딘가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믿음은 이런 상실감을 달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자면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권위와 설득력을 갖춘 인물이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럴듯한 내세관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신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신도는 그럴만한 정교한 내세관을 갖고있지 않다. 죽고 난 후에 혼령으로 남아 구천을 떠돌거나 조상신이 되어 후손의 삶에 약간의 간섭을 하는 정도다. 그래서 불교의 내세관이나 도교의 세계관을 습합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신도, 불교, 도교가 뒤엉켜 음양사라던가 모노노케物の怪라 불리는 수많은 원령, 요괴, 생령 등의 존재가 등장한다. 800만 신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을 것이다.
이 수많은 신들은 일상의 불가사의를 이해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하는데 하코네 인근 야마나시 현에는 팥을 씻는 요괴, 시즈오카 현에는 베개를 뒤집는 요괴, 후쿠오카에는 벽壁요괴 까지 동원된다. 참고로 벽요괴는 칸막이가 많은 일본가옥 구조에서 발생하는 순간적 혼란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삶의 구석구석을 신의 작용으로 설명하자면 800만 신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신들은 죽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에서 사소한 일상의 기이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관여를 한다고 믿는다.
도쿄 간다神田 진보초神保町의 유명한 고서점가에 가면 수많은 요괴화집, 요괴 카탈로그, 요괴와 기현상을 모아놓은 요괴명휘妖怪名彙(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가 1939년 일본 전국의 요괴와 기현상을 수집해 80여 종으로 구분해 정리한 목록) 등이 잔뜩 전시되어 있다. 신, 유령, 원령 등 상황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요괴라는 애매한 존재는 일본인들의 상상 속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존재로 자리잡고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 요괴영화가 양산되었던 배경이 아닌가 싶다.

- 한성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
- 저서 『안타고니즘(한중일의 문화심리학)』(2020)등 다수.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